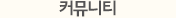클릭하여 쿠팡 방문하고 50 툴리 포인트 받기
2시간에 1회씩 획득 가능
글 수 325
궁궐 안에 꽃을 가꾸는 정원사가 새로 왔습니다.
그가 꽃을 가꾸는 솜씨는 정말 대단했습니다. 한눈에 병든 화초를 대번 가려냈고, 늘 흙투성이인
그의 손이 스쳐 가기만 해도 시들던 꽃이 생기를 얻었습니다. 하루는 임금님이 정원에
나왔습니다. 마침 새득새득한 꽃 한 포기를 돌보느라 땀을 흘리는 정원사가 눈에 띄었습니다.
"살아나겠느냐?"
임금님이 다가서서 물었습니다.
"새벽에 맑은 이슬이 내렸고, 지금은 따슨 햇볕이 애쓰고 있으니 소생할 것입니다."
정원사가 공손히 아뢰었습니다. 그런데 어찌 그 말이 임금님의 귀에는 거슬렸습니다. 신하로부터
이런 투의 대답은 처음 들은 탓이었습니다.
"예, 임금님 덕분입니다. 이렇게 몸소 나오셨으니 곧 되살아나고 말고요."
여태까지의 정원사들은 으레 이런 대답을 하였으니까요.
임금님은 언짢았지만 꾹 참고 그냥 지나쳤습니다.
그 뒤 임금님이 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정원을 거닐다가 또 정원사와 마주쳤습니다.
"예쁜 나비들이 많아졌군."
"예, 향기를 풍기는 꽃이 늘어났으니까요."
"못 듣던 새 소리도 부쩍 늘었어."
"그만큼 숲이 우거졌지요."
그러자 임금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. 얼굴도 붉으락푸르락했습니다.
"내 덕분이 아니란 말이렸다.!"
"예?"
정원사는 비로소 고개를 들고 의아한 눈길로 임금님을 바라보았습니다. 뒤따르던 신하들도
덩달아 눈 꼬리를 치켜 올리더니, 정원사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.
"성은도 모르는 저 늙은이를 그냥 두어서는 안되겠사옵니다."
잔뜩 화가 난 임금님이 명령했습니다.
"괘씸한 늙은이 같으니라고. 당장 옥에 가두어라!"
포졸들이 달려와 정원사를 꽁꽁 묶었습니다.
"내 덕 없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어디 한 번 보자. 감옥에서 꽃 한 송이만 피워 내면 풀어
주겠다."
"그러시오면, 흙 한줌만 주십시오."
정원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.
"오냐, 볶은 흙을 주마. 하하하."
정원사는 감옥으로 끌려 갔습니다. 그 꼴을 보며 신하들이 물었습니다.
"왜 하필이면 볶은 흙을 주는 겁니까?"
"혹시 꽃씨가 숨어 있는 흙을 주면 안 되니까."
"과연 훌륭하십니다."
신하들은 임금님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앞다투어 늘어놓았습니다.
감옥에는 높다란 곳에 조그만 창이 나 있습니다. 마치 감옥의 콧구멍 같습니다. 그 창을 통해
하루에 한 차례씩 손바닥 만한 햇살이 들어옵니다. 그러면 정원사는 볶은 흙이 담긴 종지를
창틀에 올려 놓고 그 햇살을 고이 받았습니다.
정원사는 가끔 물 한 모금을 남겨 그 흙에 뿌려 주었습니다. 그러기를 하루 이틀, 한 달 두 달
계속되었습니다. 일년이 지나갔습니다. 그러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
이 년이 흘러갔습니다.
그리고 삼 년을 훌쩍 넘긴 어느 이른 봄날이었습니다.
종지에 햇살을 받던 정원사는 흙 가운데 찍힌 연두색 작은 점을 발견했습니다. 갓 움튼
새싹이었습니다. 그 순간, 정원사의 눈에 맺힌 이슬 방울 하나가 그 위에 떨어졌습니다. 아마
바람이 몰래 조그만 씨앗 하나를 날라다 주었나 봐요.
"아무렴, 사람이 아무리 뒤축 들고 두 팔을 쳐들며 막으려 해도 그 높이 위로 지나는 바람을 어쩔
수 없지. 두 손바닥을 깍지껴 편 넓이 이상의 빛을 가릴 수도 없고...."
혼잣말을 하는 정원사의 파리한 얼굴에 해맑은 미소가 피어 올랐습니다.
정원사는 정성껏 새싹을 가꾸었습니다.
그 무렵 임금님이 감옥 곁을 지나게 되었습니다. 무심코 감옥을 바라보던 임금님이 깜짝 놀라
걸음을 멈추었습니다.
"아니, 저건 무슨 꽃이야!"
감옥의 창틀 위에 샛노란 민들레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. 그것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마치
별이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.
임금님의 머리 속에 어린 왕자 시절의 일이 문득 떠올랐습니다. 갈라진 돌 틈에 뿌리 내린
민들레꽃을 보고 가슴 떨렸던 기억이었습니다. 그때 왕자의 스승이었던 학자가 이런 말을
했습니다.
"저게 바로 생명입니다. 천하보다 귀하지요."
"생명은 누가 키우나요?"
"햇볕과 비와 바람.... 자연이지요."
임금님의 귀에 옛날의 그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. 비로소 그 스승의 말이 정원사의 대답과
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문득 세 해 전에 감옥에 보낸 정원사가 떠올랐습니다.
임금님은 눈을 감았습니다. 꽃 한 송이조차 오직 자기 덕에 피는 줄 알고 살았던 지난날이
부끄러웠습니다. 얼굴이 붉어졌습니다.
"어서 감옥의 문을 열어라. 어서!"
난데없는 임금님의 명령에 놀란 신하들이 갈팡질팡했습니다.
조회수 : 10698
글쓴이 : 김병규 님/동화작가
관련 URL :
기타 사항 :
그가 꽃을 가꾸는 솜씨는 정말 대단했습니다. 한눈에 병든 화초를 대번 가려냈고, 늘 흙투성이인
그의 손이 스쳐 가기만 해도 시들던 꽃이 생기를 얻었습니다. 하루는 임금님이 정원에
나왔습니다. 마침 새득새득한 꽃 한 포기를 돌보느라 땀을 흘리는 정원사가 눈에 띄었습니다.
"살아나겠느냐?"
임금님이 다가서서 물었습니다.
"새벽에 맑은 이슬이 내렸고, 지금은 따슨 햇볕이 애쓰고 있으니 소생할 것입니다."
정원사가 공손히 아뢰었습니다. 그런데 어찌 그 말이 임금님의 귀에는 거슬렸습니다. 신하로부터
이런 투의 대답은 처음 들은 탓이었습니다.
"예, 임금님 덕분입니다. 이렇게 몸소 나오셨으니 곧 되살아나고 말고요."
여태까지의 정원사들은 으레 이런 대답을 하였으니까요.
임금님은 언짢았지만 꾹 참고 그냥 지나쳤습니다.
그 뒤 임금님이 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정원을 거닐다가 또 정원사와 마주쳤습니다.
"예쁜 나비들이 많아졌군."
"예, 향기를 풍기는 꽃이 늘어났으니까요."
"못 듣던 새 소리도 부쩍 늘었어."
"그만큼 숲이 우거졌지요."
그러자 임금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. 얼굴도 붉으락푸르락했습니다.
"내 덕분이 아니란 말이렸다.!"
"예?"
정원사는 비로소 고개를 들고 의아한 눈길로 임금님을 바라보았습니다. 뒤따르던 신하들도
덩달아 눈 꼬리를 치켜 올리더니, 정원사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.
"성은도 모르는 저 늙은이를 그냥 두어서는 안되겠사옵니다."
잔뜩 화가 난 임금님이 명령했습니다.
"괘씸한 늙은이 같으니라고. 당장 옥에 가두어라!"
포졸들이 달려와 정원사를 꽁꽁 묶었습니다.
"내 덕 없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어디 한 번 보자. 감옥에서 꽃 한 송이만 피워 내면 풀어
주겠다."
"그러시오면, 흙 한줌만 주십시오."
정원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.
"오냐, 볶은 흙을 주마. 하하하."
정원사는 감옥으로 끌려 갔습니다. 그 꼴을 보며 신하들이 물었습니다.
"왜 하필이면 볶은 흙을 주는 겁니까?"
"혹시 꽃씨가 숨어 있는 흙을 주면 안 되니까."
"과연 훌륭하십니다."
신하들은 임금님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앞다투어 늘어놓았습니다.
감옥에는 높다란 곳에 조그만 창이 나 있습니다. 마치 감옥의 콧구멍 같습니다. 그 창을 통해
하루에 한 차례씩 손바닥 만한 햇살이 들어옵니다. 그러면 정원사는 볶은 흙이 담긴 종지를
창틀에 올려 놓고 그 햇살을 고이 받았습니다.
정원사는 가끔 물 한 모금을 남겨 그 흙에 뿌려 주었습니다. 그러기를 하루 이틀, 한 달 두 달
계속되었습니다. 일년이 지나갔습니다. 그러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
이 년이 흘러갔습니다.
그리고 삼 년을 훌쩍 넘긴 어느 이른 봄날이었습니다.
종지에 햇살을 받던 정원사는 흙 가운데 찍힌 연두색 작은 점을 발견했습니다. 갓 움튼
새싹이었습니다. 그 순간, 정원사의 눈에 맺힌 이슬 방울 하나가 그 위에 떨어졌습니다. 아마
바람이 몰래 조그만 씨앗 하나를 날라다 주었나 봐요.
"아무렴, 사람이 아무리 뒤축 들고 두 팔을 쳐들며 막으려 해도 그 높이 위로 지나는 바람을 어쩔
수 없지. 두 손바닥을 깍지껴 편 넓이 이상의 빛을 가릴 수도 없고...."
혼잣말을 하는 정원사의 파리한 얼굴에 해맑은 미소가 피어 올랐습니다.
정원사는 정성껏 새싹을 가꾸었습니다.
그 무렵 임금님이 감옥 곁을 지나게 되었습니다. 무심코 감옥을 바라보던 임금님이 깜짝 놀라
걸음을 멈추었습니다.
"아니, 저건 무슨 꽃이야!"
감옥의 창틀 위에 샛노란 민들레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. 그것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마치
별이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.
임금님의 머리 속에 어린 왕자 시절의 일이 문득 떠올랐습니다. 갈라진 돌 틈에 뿌리 내린
민들레꽃을 보고 가슴 떨렸던 기억이었습니다. 그때 왕자의 스승이었던 학자가 이런 말을
했습니다.
"저게 바로 생명입니다. 천하보다 귀하지요."
"생명은 누가 키우나요?"
"햇볕과 비와 바람.... 자연이지요."
임금님의 귀에 옛날의 그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. 비로소 그 스승의 말이 정원사의 대답과
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문득 세 해 전에 감옥에 보낸 정원사가 떠올랐습니다.
임금님은 눈을 감았습니다. 꽃 한 송이조차 오직 자기 덕에 피는 줄 알고 살았던 지난날이
부끄러웠습니다. 얼굴이 붉어졌습니다.
"어서 감옥의 문을 열어라. 어서!"
난데없는 임금님의 명령에 놀란 신하들이 갈팡질팡했습니다.
조회수 : 10698
글쓴이 : 김병규 님/동화작가
관련 URL :
기타 사항 :
이 게시물에는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.
첫 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:)